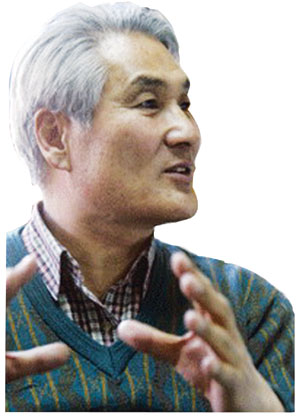
2004년 2월 14일 타계한 진보적 사회학자 김진균 교수(1937~2004)는 경기도 마석의 모란공원 민주화 묘역에 영원히 잠들었다. 그곳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영원한 청년, 만인의 따뜻한 벗, 민중의 스승.’ 그리고 고인의 10주기를 맞아 김진균기념사업회가 기획하고 제자인 홍성태 상지대 교수(문화콘텐츠학과)가 집필한 『김진균 평전─민중을 위한 학문과 실천』이 세상에 나왔다. 빠른 감도, 늦은 감도 없는 적절한 시점에 말이다. 출판기념회를 겸한 10주기 행사가 지난 14일 오후 6시 서울 명동 YWCA에서 열렸다.
진보적 학술운동의 개척자
사회학자 김진균 앞에는 늘 ‘진보적’이라는 수식이 붙는다. 그것은 그가 일찍이 ‘相資以生’(서로 도우며 살아간다)의 사회를 꿈꿔왔기 때문이다. 물론 ‘진보적’이란 수식은, 그의 육친과 얽힌 측면도 없지 않다. 동생인 김세균 서울대 명예교수(정치학) 등이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된 1979년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을 계기로 그는 실천적 삶의 현장을 누비기 시작했다. 광주민주화운동(1980), 해직(1980~1984), 6월 항쟁과 노동자 대투쟁(1987),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창립(1987) 등을 겪으면서 불의에 맞서 싸우는 ‘진보적 지식인 학자’라는 이름이 그를 따라다녔다.
그러나 김진균 교수가 실천 현장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관여했다 하더라도 그의 이름에는 ‘진보적 학술 운동의 개척자’라는 호명이 더 어울린다. 해직 무렵 제자들과 함께 만든 상도연구실을 근간으로 이듬해 발족한 ‘한국산업사회연구회’는 학계에서 진보적 사회과학 학술단체의 기원이 됐다. 한국산업사회연구회는 이후 산업사회학회, 비판사회학회로 그 명맥을 잇고 있으며, 다른 한편 1988년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라는 진보적 학술운동 단체가 만들어지는 데 추동력이 됐다.
진보적 사회과학자로서 그가 ‘민중의 삶’이라는 낮은 세상에 주목한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학문이 단조롭게 구성돼 있는 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이후 그의 학문적 관심과 행보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신자유주의가 유행처럼 한국사회와 학계에 스며들 때, 그는 민주주의 확대와 소수자 인권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또한 정보운동과 문화운동에도 참여했다. 생물학적 죽음이 그를 찾아올 때까지 그는 신자유주의 확산에 따른 전지구적 획일화와 노동의 불안정성에 주목, 비판과 대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다.
확실히 ‘진보적 사회학자’로서 김진균 교수는 너무 일찍 생을 마감했다. 그를 한참 필요로 하던 시기에, 그리고 그의 멈출 줄 모르는 지적 모색과 삶에 대한 예의가 한 시대의 師表로 가야할 길을 제시하는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김진균 평전』이 의미를 갖는 건, 바로 이런 그의 학자적 삶의 무게 때문이다.
평전의 형식대로 김진균 교수의 일생을 개인적 삶과 공적인 삶, 학자의 삶 등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하며 연대기적으로 구성했다. ‘유소년기-청년기-장년기-노년기’라는 성장사적 구성은 다소 단조로운 측면이 있긴 하지만, 한 인간이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무게를 직시하고 변화하는 서사적 내면을 보여주는 데는 효과가 있다.
“학문하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있는 지식과 이론이 기층 민중의 삶에 어떤 효과를 주는가를 가늠해야 한다. …… 학자가 직면하는 이론과 개념에 대해 진지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민중과 계급 개념을 지금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는 지구적으로 획일화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남북통일 과제에서 이 개념들이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년퇴임을 앞두고 2002년 12월 행한 마지막 강의에서 그가 한 말이다.
물론 그의 학문적 소신과 길을 달리 하는 학자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학자로 살아가는 한 인간이 자신의 신념과 학문적 지론을 끊임없이 현실에 대입하면서 검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이 지난하고 끈질긴 ‘학문하기’의 자세와 열정은 겸허하게 본받을 필요가 있다. 진보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던 이들이 제도권 안에서 변질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던 학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김진균 교수의 진보적 학문은 어떤 자리에 놓여야 할까. 그가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인 2003년 문화과학사에서 나온 『21세기 진보운동의 기획』 ‘서문’에는 아직 채 마르지 않은 그의 목소리가 묻어 나온다. “한 생애에서 격동의 세기 전환을 겪어 보기는 드문 일일 것이다. (중략) 내가 태어나기 100여 년 전도 격동의 시기였지만, 그로부터 이어진 나의 생애에도 격동의 시기가 연속되고 있었고, 이제는 아주 새로운 차원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그는 분명 ‘아주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예감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맞서야 할 지혜를 모색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는 같은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가늠하고 대비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넓고 깊게 검토하고 실현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단지 정치적 차원의 지평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전지구적 통합자본주의가 지역적으로 전지구를 포섭하는 동시에 인간 사회를 사회생활 구성에서도 미시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혹은 인간의 동기와 욕망의 구성의 모든 구석까지 포괄해가고 있다면 민주주의 기본가치도 그와 마찬가지의 범위로 따지고 확보해야 할 일이다.”
김진균의 비판적 사회과학은 역설적이다. 그가 숨을 멈춘 그 시점에서 그것은 더욱 선명하게 작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평전 머리말에서 집필자인 제자 홍성태 교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김진균론’은 무엇보다 김진균 선생이 남긴 글을 읽는 것으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김진균 선생은 1962년부터 2003년까지 41년에 걸쳐 논문, 평론, 칼럼 등 여러 형태의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중략) 사람은 가도 글은 남습니다. 사상가는 두루 깊이 탐구해서 학문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진균 선생은 민족과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를 추구한 한국의 대표적 사상가였습니다.”
과연 비판적 사회과학계를 넘어 한국 학계가 어떤 ‘김진균론’을 만들어낼 것인가. 제자의 말대로 “茶山을 가장 중요한 선학으로 여겼고, 다산처럼 현실과 밀착된 학문을, 인식과 실천이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된 학문을 추구”했던 김진균 교수의 학문이 어떤 얼굴을 한 학문인지를 제대로 따지는 일은 이제 이 평전과 함께 남은 이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