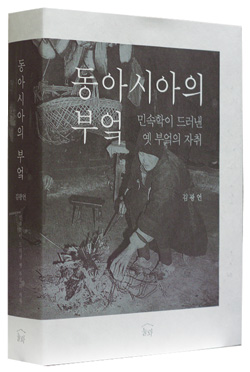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지낸 김광언 인하대 명예교수가 한·중·일 동북아시아 세 나라의 부엌에 대한 민속학 연구 성과를 책으로 펴냈다. 700쪽이 넘는 이 묵직한 책에는 화덕, 불씨, 부엌, 한데부엌, 조왕, 그릇, 솥, 숟가락과 젓가락, 박에 관한 자료가 망라돼 있다. ‘부엌’에서 흔히 만날 수 있었던 이 ‘명사’들을 어원으로 시작으로 형태, 민속 그리고 그에 얽힌 속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종합백과사전이면서도 문화지도라고 해도 손색 없다.
책을 펴내기 위해 저자는 신화, 민담 고문헌, 문학작품까지 온갖 기록과 이전의 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한·중·일의 구석구석을 직접 답사해 다양한 부엌들의 모습과 여전히 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수집했다. 책에 집적된 중국 자료는 저자가 길림, 산동, 광서, 사천, 귀주, 운남성 등지에서 얻은 것들이다. 일본 자료는 훗카이도, 동북지방, 도쿄 및 긴키 일대와 규수, 오키나와 본도와 주위의 여러 섬에서 거둔 현지 조사 자료들이다.
뭔가 더 있어 보이는 민속학적 대상들도 많을텐데 그는 어째서 이 ‘부엌’에 눈을 돌렸을까. 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이들 부엌 기물에는 옛 분네들이 느끼고 깨우친 온갖 슬기가 들어 있다.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잘 들여다보면 그들이 맛본 삶과 죽음,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의 자취가 드러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우주의 오묘한 진리까지 깨칠 수 있다.”
여기다 한 가지 사실이 더 그를 다그쳤다. 부엌이라는 낱말이 고어사전으로 밀려나는 날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수저’를 아는 고등학생이 몇 안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잊혀져가는 슬기 보따리를 캐고 풀어서 남겨야 한다.” 여기서 ‘보따리’를 찾는 일은 고고학의 몫이고, 거기서 나온 기물이 지닌 뜻을 캐는 일은 민속학의 일이다.
김 교수의 말대로 한국 민속학이 주춤거리는 사이 고고학은 눈부시게 발전했다. 1980년대까지도 시대 구분이 구석기·신석기·청동기로 나뉘었지만, 지금은 잘게 쪼개졌다. 분야도 부뚜막·우물·숟가락 따위로 넓혀졌다. 김 교수는 이런 세분화가 바람직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는 바람에 민속학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긴 나머지, 젊은 고고학도들은 이웃 학문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우려한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지적한다. “제 아무리 많은 유적을 뒤져도 그 뜻을 캐지 못하면 얼빠진 몸뚱이를 부여잡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유물 설명이 기껏 형태나 크기에 머무는 것도 아쉽지만, 엉뚱한 이름 붙이는 것은 작은 문제가 아니다.” 자, 이쯤이면 그가 어째서 부엌을 주목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리라.
그래도 의문은 남는다. 부엌 하나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낼 수 있을까. 시선을 조금 바꿔보면 대답은 ‘충분히 가능하다’가 된다. 부엌은 예로부터 음식을 만드는 것은 물론 온기를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는, 집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 숱한 전설과 설화를 품고 있다. 부엌과 관련 속담도 많지 않은가. 불은 그 자체로 까마득한 선사시대 때부터 인간들에게 신성시돼온 존재였고, 나아가서는 불씨를 보관하고 불을 피우는 아궁이와 부뚜막, 여기서 더 나아가 부엌이란 공간 전체가 한 집안의 복과 운을 좌우하는 신령한 존재로 떠받들어졌다. 부엌을 관할하는 신인 ‘竈王’에 대한 신앙은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때까지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고, 중국에서는 청나라 시절에 이르면 아예 조왕이 ‘가정의 주인’으로 섬겨지기에 이른다. 그릇과 같은 세간, 조리도구를 대표하는 솥, 식기도구인 숟가락과 젓가락 등도 숱한 상징과 신화를 담고 있는 존재임을 이 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일본, 한국의 부엌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저자가 정리한 한·중·일의 부엌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훑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지만, 또 어떤 점에 있어서는 다른 꼴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엌 그 자체도 중국에서는 그 역할이 조리가 주인데 반해, 한국에서는 조리와 난방의 기능을 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숟가락, 젓가락에서도 구분된다. 저자에 의하면, 중국은 ‘수정의 본고장’이고, 한국은 ‘숟가락 위주의’, 일본은 ‘젓가락만 남은’ 곳이다.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를 김 교수의 표현으로 바꾸면, ‘중국은 뿌리, 한국은 둥치, 일본은 가지’이고, 세 나라의 문화는 ‘한 그루에서 피어난 꽃’이 된다.
저자는 서울대 국어교육과와 고고인류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전북대 조교수와 국립민속박물관장을 지냈으며, 현재 인하대 명예교수로 있다. 지은 책에는 『한국의 농기구』, 『한국의 주거민속지』, 『풍수지리』, 『한국의 부엌』, 『한국의 집지킴이』, 『지게 연구』, 『뒷간』, 『쟁기 연구』 등이 있다. 남들이 쉬 가지 않은 길에서 묵묵히 성과를 길어 올린 셈이니, 그의 말대로 보따리의 의미를 캐는 일에 일생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