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정합니다. <교수신문> 제1195호에 실린 신지영 경상국립대 교수(철학과)의 '저자가 말하다'의 책 표지와 서지정보가 잘못 게재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잘못된 서지정보를 게재한 점, 역자 분과 출판사 관계자 분, 독자 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교정교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정정 전: 저자가 말하다_『들뢰즈의 정치-사회철학』 신지영 지음 | 그린비 | 336쪽
정정 후: 역자가 말하다_『대담』 들뢰즈 지음 | 신지영 옮김 | 갈무리 | 336쪽
철학의 임무는 개념을 창조하는 것
현재 사유해 내는 새롭고 낯선 개념
질 들뢰즈의 『대담(Pourparlers)』이 1993년에 우리말로 최초 번역된 이후 30년 만에 다시 번역 출간됐다. 이 책은 1972년부터 1990년 사이에 이루어진 인터뷰와 편지·미발표 원고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 시기에 출판된 단독 저서 『시네마 1·2』, 『푸코』, 『주름』, 『페리클레스와 베르디』 등과 가타리와의 공저 『자본주의와 분열증 1·2』 등에 대한 인터뷰가 주를 이룬다. AI나 챗지피티 정도의 이슈가 아니면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없는 시대에 들뢰즈의 책이 여전히 현재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1700년 이상 지탱돼 오던 영원불변한 것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과학혁명의 시대에 칸트가 과학적 진리를 정당화하는 조건을 정립하는 것으로 철학을 자리매김한 이래, 철학은 끝이 났다든지 형이상학이 극복됐다든지 하는 말들이 있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제 철학 따위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또한 철학은 컴퓨터공학·IT·마케팅 권력 앞에서 작아지고 외로운 처지다(251쪽). 그런데 들뢰즈는 칸트의 비판이 무효라고 생각하며 철학은 완벽히 현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51쪽). 우리가 들뢰즈를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 아닐까.
들뢰즈는 시종일관 철학의 임무는 개념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를 사유해낼 수 있는 새롭고 낯선 개념을 만드는 일은 철학이 단순한 의견이나 잡담으로 전락하지 않는 조건이다. 즉, 개념은 사유의 도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사유의 도구는 그가 집대성한 논리학(Organon)으로 간주돼 왔으나, 실상 사유의 도구는 개념이다. 개념들로 포착되지 않은 현실은 사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들뢰즈가 혁신한 개념들은 이미 많이 소개됐다. 차이·반복·다양체·리좀·분열분석·고원·잠재적인 것 등이 그러한 것들이다. 이 책에서도 역시 그의 개념에 대한 몰두를 확인할 수 있다. 시네마에 관한 장(2장)에서 눈에 띄는 고다르에 대한 인터뷰는 고다르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6곱하기 2」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들뢰즈는 고다르의 작업을 「노동력」과 「정보」라는 두 ‘개념’으로 정리한다. 푸코에 관한 장(3장)에서는 「인간의 죽음」, 「주체로의 회귀」 등, 푸코를 둘러싼 개념적 논란과 오해를 푸는 데 마음을 쓰며, 철학에 관한 장(4장)에서는 라이프니츠의 「주름」 개념과 스피노자의 「문체」에 대한 멋진 설명을, 그리고 「중재자(intercesseur)」라는 낯설고 흥미로운 개념도 만나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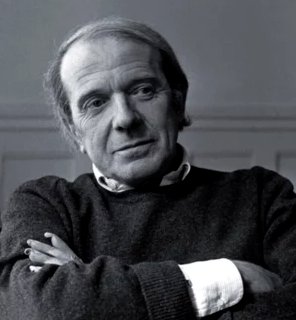
역자로서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무엇보다 그의 정치철학적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1장과 5장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의 정치철학이 정립돼 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그가 초기부터 생각한 정치철학의 형태가 어떤 것이었는지 직접 들어볼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흄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제도」, 「법학/판례」, 「권리」 등을 둘러싼 정치철학적 아이디어를 충분히 전개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특히 5장 2절, 책의 마지막을 장식한 「통제사회에 대한 후기」라는 제목의 짧은 글은 이 책의 백미라 할 수 있다. 18세기와 19세기를 규율사회로 규명한 것이 푸코라면, 20세기 그리고 현재의 우리 사회를 ‘통제사회’로 명명하고 그 가공할 모습을 그린 것은 들뢰즈라 말할 만하다. 학교·병원·감옥에 무차별적으로 스며드는 기업의 영혼, 무한 경쟁과 보조금의 차등 배분, 매년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지표들에 의해 미분적으로 조정되는 성과급적 연봉의 체계, 생산과 소유권에 기초한 자본주의가 아니라 판매와 보편화된 기업으로 수렴되는 자본주의가 바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통제사회의 모습이다.
이 책은 그가 평생 몰두했던 것이 무엇이며 그가 누구였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는 평생 개념의 창조에 몰두했으며, 자신이 만든 개념들로 권력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던 전쟁기계였다. 과학의 가속화된 혁신과 고도화된 자본주의가 결합해 빚어지는 문제를 사유하기 위해, 사유의 과정이 자본 앞에서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욕망이 자본에 포획되고 잠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는 끝없이 도주했던 것이다.

신지영
경상국립대 철학과 교수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