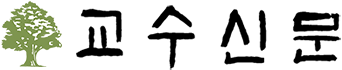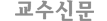어느 날 거리에서 군인 하나를 보았다. ‘저런 어린 애한테 국방을 맡겨도 되나?’ 싶도록 너무나도 앳돼 보이는 친구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의 계급장을 보니 이게 웬일, 소령이 아닌가. 나이 먹은 게 이런 식으로 표가 나는구나. 하긴 소령이면 30대 초반이니 어려 보일 만도 하다.
나이를 먹으니 시간이 더 빠르다. 마흔이 됐다고 놀라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모레면 쉰이다. 옛말에 나이 40을 불혹, 50을 지천명이라 했다. 도덕책에서나 봤던 단어들이 이미 내 나이를 수식하고 있다. 나는 어떻게 나이를 먹고 있는가.
불혹, 공자께서 하신 말씀으로, 나이 40이 되자 더 이상 미혹되는 일이 없었다는(不惑) 뜻이다.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경지가 불혹이다. 그런데 말이 쉽지 나는 공자가 아니다.
공자가 누구신가. 예수, 석가와 함께 인류 3대 성인으로 꼽히는 분이 아닌가. 그런 분이 40년의 공부와 수양으로 이룬 경지를 나이만 40이 됐다고 나 같은 범인이 도달할 리 없다. 그렇다면 40이 불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공자님과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불혹이 나이 40을 뜻하는 용어로 굳어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이 40이 되면 대개 커리어에서나 개인적 삶에서나 어느 정도의 위치에 도달한다. 직장에서는 서투르던 신입 시절을 지나 경력이 쌓이면서 중간관리자로 자리매김하고,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하고 아이 한 둘을 기르고 있을 때다.
이쯤 되면 하고 있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전망이 썩 좋지 않아도 새로운 선택을 하기가 망설여지게 된다. 이른바 귀환 불가지점(point of no return)을 지난 것이다. 새 직업을 갖기에는 그간 쌓아온 경력이 아깝고, 새 분야에서 지금처럼 자리를 잡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다.
부부사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지 않는 담에야 사는 게 다 이렇지 싶고 실제로 남들도 다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인다. 아이들이라도 있으면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 것이다. 불혹이란 40이 넘으면서부터는 더 이상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닐까?
40대들은 직장에서 구르고 가정에서 깎이면서 웬만한 일에도 미혹되지 않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나이 50이 되면 지천명(知天命)에 이른다. 하늘의 뜻을 안다는 뜻이다. 그러나 50이 넘은 사람들 중에도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지가 천명을 안다고 주장할 뿐이다. 그래서 ‘지천명’인 것일까.
지가 천명을 안다는 믿음, ‘어차피 세상은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라고 한다. 이 개념을 창안한 멜빈 러너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 세상이 정의롭고 공평한 곳이라고 믿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믿음과 반대되는 너무나 확연한 불의나 부당함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 사람들은 믿음을 바꾸는 대신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는 쪽으로 인지의 내용을 바꾼다.
누군가 정당한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고 있더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러한 일을 당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는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자들도 옷을 단정치 못하게 입고 다닌 잘못이 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그렇다’와 같은 반응들이 대표적이다.
살면서 인생의 단맛과 쓴맛, 빛과 어둠을 웬만큼 겪었을 50대가 되면 자연히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게 마련이다. 그러고 보면 50을 지천명이라고 하는 데에도 이유가 있어 보인다. 50이 된 나는 천명을 알아야 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은 늘 정당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민 문화심리학자
문화라는 산을 오르는 등반가. 문화와 마음에 관한 모든 주제를 읽고 쓴다. 고려대에서 사회및문화심리학 박사를 했다. 우송대 교양교육원 교수를 지냈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