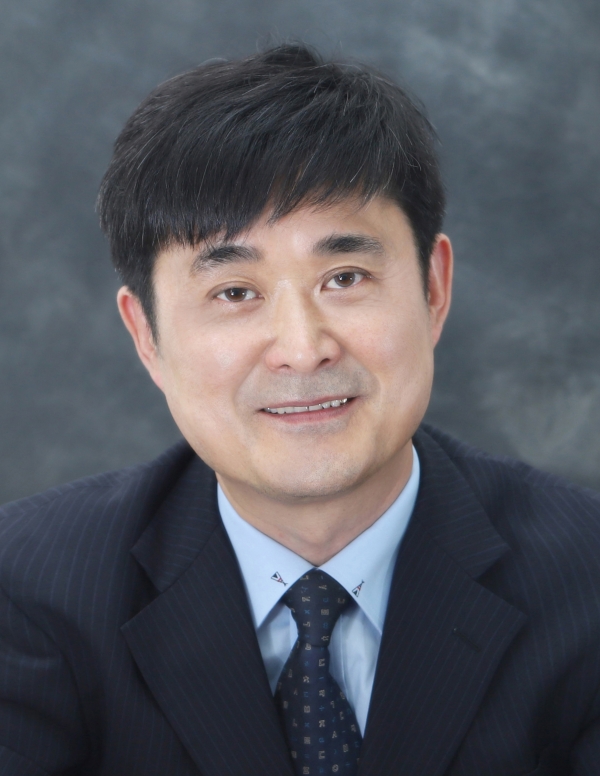
교수들은 보통 단합이 잘 안 된다. 다들 개성이 강한 측면도 있지만 각자가 자기 학문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가장 결정적인 국면은 어떤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 초안을 회람하고 서명을 권유할 때 나타난다. 성명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한 문장이나 한 구절이 문제가 있어 서명하기 어렵다는 것. 그 구절을 다시 고쳐 가면 더 완곡한 표현이어야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하다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다.
만인을 만족시키는 표현이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심지어 일제강점기의 기미독립선언서(己未獨立宣言書)나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라 할지라도. 무슨 야쿠자 조직도 아니고 교수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것 자체도 본질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는 하다. 진리는 우리의 빛이 아니라 ‘나의 빛(lux mea)’이기 때문이다. 뭉치지 못하는 교수 집단을 일컬어 모래알 조직이라고도 한다. 모래알 조직에는 불신과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다.
그에 비해 군대는 진흙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하 관계가 분명하고 단합이 잘 돼 진흙처럼 똘똘 뭉치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선 군부대에서 거수경례를 할 때 ‘단결’이란 구호까지 복창하겠는가. 중국 산시성의 진시황릉에서 1.5km 떨어진 병마용갱(兵馬俑坑)에는 진흙을 구워 만든 수많은 병사들이 있다. 똘똘 뭉쳐 죽은 황제까지 지키는 진흙 군대(Terracotta army)다. 진흙 조직은 공통의 정체성과 강력한 지휘 체계로 뭉쳐 탁월한 성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럼에도 교수 사회는 진흙 조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교수는 군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수회도 있고 교수노조도 있지만,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로 움직이는 군대의 대대나 연대의 구조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모래알 조직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상의 자유가 넘실대는 공론장의 주인들이지만 교수들은 대안도 없이 논쟁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의사결정에 있어서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준다.
교수 사회도 모래알 조직으로 남기보다 강가에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모래톱 정도로 최소한의 집단을 이룰 수는 없을까? 이론과 학문에서는 자유로움을 추구하되 어떤 행동이 필요할 때는 뭉치는 자기 양보가 필요하다. 나아가 모래와 진흙이 섞인 ‘모래 진흙’ 정도라도 됐으면 좋겠다. 모래 진흙은 사양토(沙壤土)라고 하는데, 모래에 진흙이 비교적 적게 섞인 보드라운 흙이다. 공기와 물이 잘 스며들고 비료도 빨리 분해돼 농작물이 잘 자란다.
의사 결정의 작물을 모래알에 심을 때보다 모래 진흙에 심었을 때 그 주장이 더 힘을 받고 현실적 적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모래 진흙에 뿌리박은 생각의 작물들이 무성하게 성장하면, 언젠가 교수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지성의 사암(沙巖)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암은 모래알이 모여 뭉쳐진 것이 굳어져서 이루어진 암석으로 퇴적암의 일종이다. 모래알 같은 각자도생의 능력은 연구실과 논문에서만 발휘하고, 학과회의나 행정 영역에서는 진흙 조직의 특성을 접목했으면 싶다. 교수 집단의 사회적인 실천 행동도 모래 진흙의 토양에서 출발해야 한다. 모래에 진흙을 살짝 섞어 보드라운 흙으로 만드는 교수들의 지혜와 양보심이 필요한 때다.
김병희 편집기획위원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