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상적 지식이나 개념적 앎을 어떻게 아는가
창의력 발휘 위해 철학적 사고는 왜 중요한가
과학자에게 철학 공부가 왜 필요하며, 철학자에게 과학 공부가 왜 필요한가? 영국 철학자 콜링우드(R. G. Collingwood. (1889∼1943))는 저서 『자연이라는 개념』(1945)Nature (1945)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 자신의 과학을 철학적으로 반성해보지 못한 과학자는 결코 조수나 모방자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에 … 특정 분야의 자연과학에 종사해보지 못한 철학자는 결코 어리석은 철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말을 해석하자면, 과학자는 창의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철학적 사고를 해야 하고, 철학자가 유용한 철학을 연구하기 위해 과학을 알아야 한다. 실제로 과학과 철학의 관계가 그러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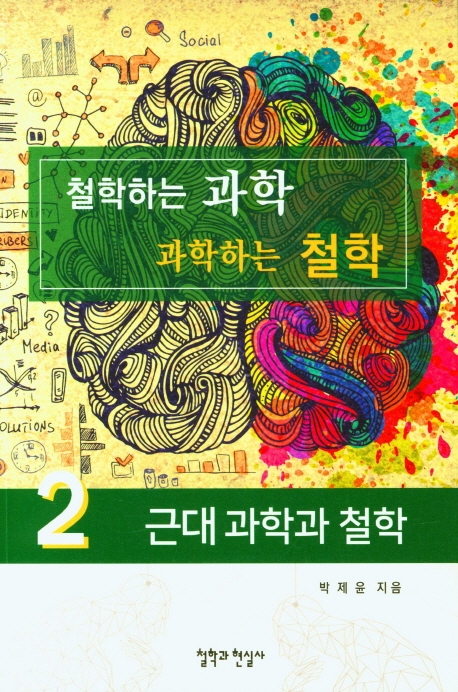
처음부터 그리스 철학은 학문의 원리에 대한 탐구로서 시작되었다. 피타고라스는 “지혜로움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로 스스로 “필로소퍼(philosopher)”라고 불렀다. 그가 말하는 필로소퍼는 “세계의 원리를 아는 자”를 말한다. 지금까지도 대가라 불리는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분야에 대한 원리에 “왜?”라는 궁극적 질문을 던지는 철학자이었다. 어느 학자가 그러했는가?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공부하고 가르치며, 기하학은 눈에 보이는 도형을 넘어 상상되는 추상적 도형을 다룬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기하학 지식의 근원에 대해 궁금해했다. 그런 추상적 지식 혹은 개념적 앎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을 연구하며, 자신이 관찰로부터 귀납적으로 일반화(가설)를 얻어내고, 그 일반화로부터 연역적으로 다른 관찰을 예측하거나 설명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학문을 연구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일반화 혹은 가설을 쉽게 얻어낼 방법, 즉 발견법이 무엇인가?
이러한 그들의 문제는 서양 철학사 전체를 관통하였으며, 인공지능 시대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궁금하다. 인공지능이 추상적 개념을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일반화 또는 이론을 가질 수 있는가? 이 대답을 위해 우리는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론 자체가 무엇인지 철학적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의 인공지능 연구자는 자신의 문제가 사실은 철학적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문제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시작된 물음인 것을 알고는 있을까?
그리스 시대 유클리드는 엄밀한 기하학 체계를 완성했다. 그 체계는 서양 철학자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 공리적 체계가 그 분야 지식을 진리로 만들어준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데카르트는 자기 철학 체계 역시 공리적 체계로 구성하려 했고, 그 확실한 기반으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를 찾았다. 그 철학을 공부한 아이작 뉴턴은 자신의 역학 체계를, 자명한 운동법칙 3개로부터 엄밀한 공리적 체계로 구성했다. 칸트는 뉴턴을 공부하고, 그 역학 지식을 “이성적 사고만으로 확장되는 진리의 지식”이라는 의미에서, “선험적 종합판단”이라 불렀다. 그는 『순수이성비판』(1781)에서 그런 훌륭한 지식(수학, 유클리드 기하학, 뉴턴 역학, 자기 철학)을 우리가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지를 설명하였다.
그런데 1900년대 전후 수학, 기하학, 물리학에 혁명적 발전이 있었다. 수학자 가우스에게서부터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나왔고, 그러한 기하학 공간이 실제적이라고 1905년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밝혀주었으며, 1930, 31년 괴델의 “불완전성 이론”은 수학도 완전한 체계가 아님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인슈타인과 하이젠베르크는, 칸트가 말했던 “선험적 종합판단”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더구나 그러한 과학 지식의 성장과 함께,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다. 그런 시대적 배경에서 하버드의 프래그머티즘 철학이 탄생했다. 그 철학의 창시자 퍼스에서부터 최근 콰인 그리고 『과학혁명의 구조』(1962)를 저술한 토머스 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철학이 진리의 “지식”이 아닌, 유용한 “믿음”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바꿨다. 그리고 그렇게 철학하는 최선은 경험 과학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경험 과학에 근거해서 철학하자는 콰인의 주장에 따라, 처칠랜드 부부는 신경철학(neurophilosophy)을 주창했고, 뇌과학과 인공신경망 AI에 근거하여 전통 철학 문제에 대한 대답을 시도한다. 그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문제, 즉 우리가 추상적 개념 및 과학적 가설 혹은 일반화를 어떻게 가지는지 가설적으로 제안한다. 그 가설대로 오늘날 인공지능은 추상적 개념과 일반화를 갖는 기계로 등장했다.
이러한 과학과 철학 사이의 역사적 이야기는 최근 첨예한 철학적 논제와 관련된다. 정신 영역을 물리적 뇌 연구에 근거해서 설명하려는 것은 (곤란해 보이는) 환원주의가 아닌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는 과학을 통해 철학 문제를 해명하려는 통섭 연구인데, 학문 연구는 통섭이 아닌 융합이어야 하는지 의심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신경계가 어떻게 창의적일 수 있는지, 나아가서 인공신경망 AI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계일지 의심되기도 한다. 최종의 질문으로, 우리가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 왜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하는지도 설명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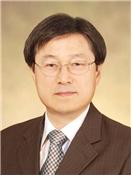
박제윤
인천대 기초교육원 객원교수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