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영국 에딘버러에서 열린 제1회 동아시아 소장 연구자 학회 및 제4회 유럽 한국학 대학원생 연합 학회에 참석한 제갈춘기 영국통신원으로부터 유럽에서의 동아시아학과 한국학의 위상을 소개한 데 이어(교수신문 2007년 11월 5일자), 유럽 한국학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교수신문은 유럽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들과의 좌담회를 기획했다. 좌담회는 참석자 모두가 유창하게 한국어를 구사해 대부분 한국어로 진행됐고, 부분적으로 영어로 진행되기도 했다. 유럽 한국학자들의 고민을 들어본다.
●일시 ·장소 : 2008년 2월 22일(금) 오후 2시, 런던대 SOAS(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한국학 센터
●참석자 : 연재훈 런던대 교수(일본·한국학과장, 한국어 및 한국언어학 전공),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한국 근세사 전공), 스테판 크놉 런던대 SOAS 한국학센터 연구원 (한국언어학), 오웬 밀러 런던대 SOAS 한국학센터 연구원(한국경제사 전공)
●진행·정리 : 제갈춘기 영국통신원(카디프대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사진 : 김정희 (런던 LSE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사회: 교수신문을 대신해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린다. 한국학의 현주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말씀해 달라.
오웬 밀러 (이하 밀러): 한국학이 한국에서 어떻게 인식돼 있는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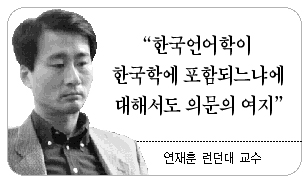
박노자: 아직까지는 개별적인 (해외 한국학) 학자들의 학문적 성과를 한국 학계가 잘 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마르티나 도이힐러(Martina Deuchler) 교수의 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 Korea: A Study of Society and Ideology(이 책은 1992년에 하버드대 출판부를 통해 출판됐고, 『한국사회의유교적 변환』이라는 제목으로 아카넷에서 2003년에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됨)를 동아대 이훈상 선생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는데 조선사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도이힐러 선생은 원로라는 위치에 있어 그 분의 학문적 성과가 학계에 소개는 많이 됐는데 소화는 많이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든다. 해외에서 한국학을 하시는 분들과 국내 학자들 간에 아직 거리가 있지 않나 싶다. 이유는 갖가지이고 국내외 학자 양측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연구성과를 출판하고 한국학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채널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스테판 크놉 (이하 크놉): 한국에 대해서 쓰면 여기 언어학계에서 출판되기 어렵고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다. 한국에서는 영어로 집필하면 오히려 환영을 하는데 정말 대화가 되는지, 담론의 일부가 되는지 의문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해서 이전에 비해서는 담론형성에 기여를 하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의문이다.

밀러: 박노자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한가지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내가 만나본 한국학자들은 대부분 외국의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를 할 경우 굳이 한국전문가와 연구협력을 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뭔 말이냐하면, 한국경제사 연구자가 외국의 한국경제사 전공자와 연구협력 관계를 갖기보다는 유럽경제사 전공자와 협력을 하는 경우가 반대의 경우보다 더 빈번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아직까지 한국에서의 연구가 학제적 틀 안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노자: (다른 참석자들에게) 실제로 느끼시기에 유럽학계의 성과가 한국에 얼마나 알려져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연재훈: 과거보다는 잘 받아들여지고 있고 더 많은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는 박 교수의 지적에는 동의한다. 유럽에서 한국학의 현 주소라는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가보자. 한국학 연구자의 인원만 놓고 본다면 북미에 비해서 적지만 인문학 분야 (역사, 문학) 연구 성과의 깊이는 북미쪽보다 더 깊다고 생각한다. 특히 전근대 한국 사회, 역사 분야는 북미보다 훨씬 강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문학과 역사분야 한국학의 깊이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물론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학과 해외에서 생각하는 한국학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정의하는 한국학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정의하는 한국학이 서양에서 정의하는 한국학과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학은 한국과 관련된 현상을 다루는 학문이다’ 라고 넓게 개념을 확장해서 언어학이든 사회학이든 정치학이든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한국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 데이터만 한국의 것을 가져다 쓰는 개량적인 사회과학은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말 구사 능력이 한국학자에게는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즉, 적어도 인문학을 하려면 1차적인 자료를 한국말로 읽고 쓸 줄 알아야 한다고 본다. 북한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된 자료가 아직까지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사회과학의 경우도 영어로 의사소통이 되는 사람은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보수적이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 아닌가. 영어로 번역되지 않은 책도 읽을 수 있고 영어를 못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에게는 바람직한 요건이라고 본다.

박노자: 크롭 선생 말씀에 한 실례를 들자면 3년 전쯤에 옥스퍼드 대학에서였던가 한 한국학 교수가 그만둘 위험에 처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한국 언론에서는, 조선일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만약에 유럽에서 한국학자가 없어진다면 독도 영주권을 누가 주장할 것인가” 하는 논지로 사설을 낸 것을 본 적이 있다. 유럽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주장을 과감하게 대변하는 ‘확성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은 위험할 수 있다. 지금 한국이 장기 보수정권 집권기에 들어 선 것 같은데 보수, 진보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지 않은가. 잘못했다가는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에게 한국을 그릇되게 대변한다 혹은 한국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비난하는 매카시적인 인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80년대 전두환 독재 하에서 관변학자들이 당시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지한 일본학자에게 그런 비판을 많이 했었다. <世界>라는 잡지에 당시 한국 인권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지명관 교수가 그런 비판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이다.

크롭: 나도 동감이다. 연구기금이라는 이름으로 해외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압박이 가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현재는 연구자의 의견이 많이 수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한국에서 보는 한국학에 대한 인식이 연구자 스스로가 위험한 토픽은 피하게 하는 일종의 자기검열 기제로 작동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가 인지를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 생각하는 한국학과 외국에서 한국학이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