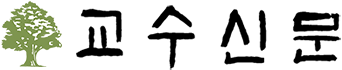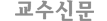제자 자로가 정치에서 무엇을 먼저 할지 묻자, 공자가 이름을 바로 잡겠다고 답한다. 자로는 공자의 현실 감각을 불평하지만, 공자는 그런 자로를 질책한 후 이름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름을 바르게 한다는 ‘정명(正名)’의 출처이다. 명칭의 중요성은 명칭이 정확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를 만나면 절실해진다.
문재인 정부는 기초연구비를 2배로 늘린다고 공약했다.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의 예산은 1.26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었다. 처음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연구비의 증액이 실현된다고 환호했다. 곧 기초연구에 인문사회가 포함되지 않음을 알고 실망한다. 기초과학자 역시 그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님을 알았다.
더구나 현 정부는 앞선 정부에서 이미 예산을 두 배나 올려주었으니 더 늘려줄 수 없다고 한다. 연구비의 증액으로 학문후속세대를 살리겠다던 인문사회나, 실험 장비 개선과 연구 성과의 획기적 발전을 기대한 기초과학 모두 실망이 컸다.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에는 자연과학단이나 생명과학단 외에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등이 속해 있다. 기초연구가 기초과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문사회는 스스로 기초학문이고 기초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홍길동과 같은 처지이다.
기실 기초연구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원 방식을 의미한다. 이는 과학재단과 학술진흥재단이 통합하여 출범한 한국연구재단의 태생적 한계와도 관련이 있다. 과학재단에서 지원해온 기초연구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면서 통합 전 학술진흥재단에서 해온 인문사회의 기초연구는 배제되었다.
기초연구진흥법은 기초과학진흥법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기초과학 대신에 기초연구라는 말을 쓰면서 원래의 법률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 ‘화물생지’(化物生地)의 기초과학은 여전히 홀대받고, 거점국립대학조차 자연대학이 없어지고 있다.
기초과학자들은 과학기술 정책연구 조직인 STEPI나 KISTEP 등을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불신은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인문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술기본법과 정책연구기관 설립에 대한 냉소적인 반응도 여기에서 나온다.
선도국가를 지향한다면 추격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대부분 동의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의견이 다양하다. 서울대 이정동 교수는 ‘최초의 질문’을 강조한다. 중요한 지적이다. 챗GPT 등장으로 질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최초의 질문은 원래의 것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다. 기초과학, 기초학술에 대한 중시를 말한다.
자연대학이 문을 닫고 있는데, 반도체 학과를 증설한다고 반도체 분야에서 가장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을까?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정치, 경제를 연구하는 학문은 차치하고라도 물리학을 비롯한 관련 기초과학이 무너진다면, 이는 근시안적 시각일 뿐이다.
이름을 바로 잡아야 한다. ‘기초’, ‘응용’, ‘개발’이 고정된 순서는 아니어도, 기초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해야 한다. 기초연구가 제대로 정의되지 않으면, 기초학술의 두 축인 기초과학과 인문사회의 어려움은 물론 기술개발도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과학기술계에서 그간 논의가 있었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인문사회계가 포함된 논의를 통해 이름을 바로 잡자.
이강재 논설위원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번역 제공
번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