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세 교수(울산대·생명과학부)
필자가 학생이나 연구원들에게 강조하는 연구의 기본자세는 평범한 진리이다; 읽기(reading), 실험(bench)과 쓰기(writing) 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분야의 저널을 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면서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생각을 할 수 있다. 부지런히 의자에서 일하여 연구결과를 내고 이를 기록하여 발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게을리 하거나 이를 하지 않으면, 과학자로서 자격이 없고 성공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우리 실험실은 이를 교육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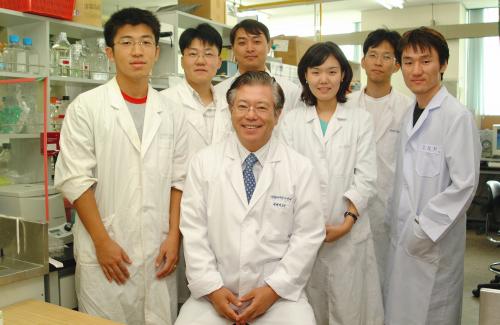 |
| ▲권병세 교수(앞줄 가운데), 뒷줄 왼쪽부터 강우진, 김영호, 최재혁, 이선경, 최범규, 김광휘 연구원 © |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아침시간을 이용하여 최근 발표된 좋은 논문을 읽고 발표한다. 연구원을 5개의 팀으로 나누어 각자가 일주일에 한번씩 자기의 벤치워크(bench work)에 대하여 상세히 토론할 기회를 준다. 또 한번 금요일에는 전체가 모여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한 발표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 예로 석사 1년차 등 경험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매일 한 일에 대한 결과 분석 및 실험실 생활에 대하여 하루도 빠짐없이 메일로 필자에게 써서 보내도록 하고 있다. 처음에는 몇 줄 밖에 안 되고 내용도 부실하고 짜임새도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필자의 질문 등에 답변하다 보면 자연히 내용이 짜임새가 있고 논리가 서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그룹 미팅 시 자기의 계획이나 결과를 말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논문을 쓰는 연습을 하도록 한다.
돌아보면 필자는 미국에서 1984년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스무 해 이상(지난 6년간은 고국에서도 실험실을 열었고) 양국에 각각 실험실을 운영하면서, 두 나라 사이의 문화의 차이와 연구비 조성에서의 차이점 등이 재미있었다. 우리 울산대 실험실은 지방대인데다 우리나라가 특히 면역학 분야에서(특히 동물실험 등에) 취약하기 때문에, 처음 실험실 운영은 대단히 어려웠다.
특히 학생들이 자신감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른바 지방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패배감을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실험실을 연 첫 해에는 논문이 한 편도 나오지 않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을 한 명씩 미국의 실험실로 초청하여 일 년 동안 머무르면서 일 대 일로 집중교육을 하였다. 이들이 돌아와서 후배들을 교육함으로써 실험실의 정상 가동이 가능하였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점은 선배가 후배를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한국적인 문화가 큰 몫을 한 셈이라는 사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2년차부터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박사 과정의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창의력과 자생력이다. 필자는 실험 계획을 세울 때 여타 연구팀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만약 이 실험이 발표될 때 어떤 새로운 점을 강조할 것인가를 묻는다. 생각의 한계를 넓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강요하는 동시에, 발표된 논문을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고 실험계획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시키는 일을 혼자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위하여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비를 신청하게 한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