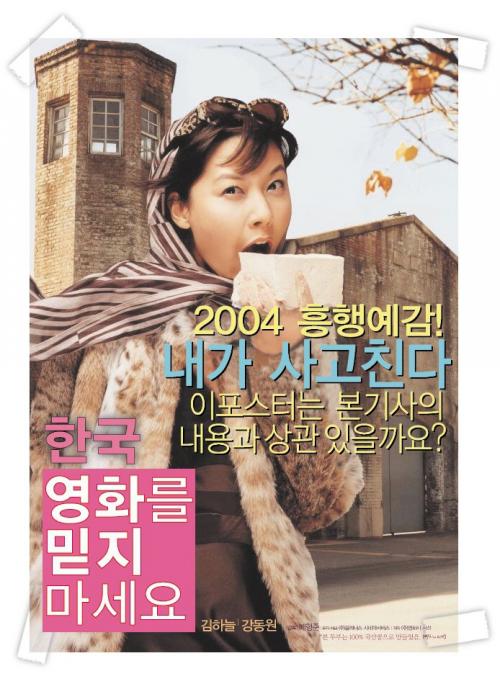 |
지난 상반기 ‘태극기…’와 ‘실미도’ 두 영화가 벌어들인 순수익은 3백80억원에 달했다. 반면 나머지 33편의 개봉영화는 통합 3백86억원의 손실을 냈다. 이중 22편이 적자를 기록했고, 제작비의 절반도 못 건진 영화들도 수두룩하다.
하락세를 더욱 부채질 한 것은 올여름 호러물이었다. 베트남전을 소재로 새로운 공포의 장르를 연 ‘알포인트’를 제외하곤 흥행 대실패로 막을 내린 것. 홍보에 박차를 가했던 ‘페이스’는 13만명, ‘령’은 23만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장화, 홍련’ 83만명의 20% 수준이다.
올 하반기 시장은 더욱 불투명하다. 9월부터 12월까지 16편이 개봉예정인데, 이중 단 3편만이 흥행예감작으로 거론된다. ‘썸’(10월, 감독 장윤현)과 ‘주홍글씨’(10월, 감독 변혁)는 스타캐스팅과 웰-메이드(well-made)를 무기로 2백만 확보를 전망하고, 1백억원 제작비를 쏟아부은 최대 기대주 ‘역도산’(12월, 감독 송해상)은 5백만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역도산’의 경우 비슷한 컨셉트의 ‘바람의 파이터’가 올 여름시장에서 ‘찬바람’을 맞았던 점, 한일합작 영화가 성공한 케이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들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올 하반기 한국영화 점유율은 30%대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예상된다.
위기의 징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통계에 따르면 ‘태극기…’와 ‘실미도’를 제외한 흥행성공작들의 작품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특히 4위를 기록한 ‘어린 신부’는 순전히 배우들의 인기도에 힘입어 성공했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반면 화려한 액션과 치밀한 시나리오로 한국영화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렸던 ‘올드보이’, ‘범죄의 재구성’ 등은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에 비해 거둬들인 돈주머니가 너무 가벼웠다. 재미와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傑物’들이 고정관객을 확보하지 못하자, 이효리?윤계상 등 아이돌 가수들을 끌어들여 확실한 시장을 담보로 자본이 투자되는 보수적인 제작관행이 머리를 들고, 성공작 베끼기에 너도나도 뛰어들어 이전투구를 벌이는 상황이 영화판을 더욱 을씨년스럽게 하고 있다.
전범수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미디어산업)는 내적 다양성이 떨어지고 영화가 획일화되는 현상을 두고 “한국영화는 추락을 예고하는 셈”이라고 진단한다.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 또한 “정점에 달한 한국영화시장에 투기성 자본들이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자본의 블랙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할인을 통한 극장들의 제살 깎아먹기 경쟁, 그럼에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들, 스타의존도에 따른 제작비 부담 증가, 극장 및 제작사에 점점 침투되는 대기업들의 손길로 한산해진 영화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충무로는 고충을 털어놓고 있다. 과연 한국영화는 ‘몰락’의 예비신호를 받고 있는 것일까.
이은혜 기자 thirteen@kyosu.net
 번역 제공
번역 제공


물론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교수의 생각을 적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통의 관심사항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읽어봐도 기자 개인의 관심안을 못벗어나는 것 같군요.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