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일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자.
궁금증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 구글을 헤매다 우연히 헤저 윌더스(Hedzer Uulders)의 박사학위 논문(『프랑스국립도서관 프랑스어 수고본 837번에 실린 ‘사랑의 인사’ 및 ‘사랑의 비탄’에 대하여(Autour des saluts et complaintes d’amour du manuscrit BnF f. fr. 837)』, 2010)을 발견했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넘겨보는데 원래 질문과 무관한 후렴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연인이여, 결코 당신 벗들을 보내 / 제게 인사를 전하지 마세요. / 사자(使者)를 통해 오가는 사랑이 / 배신 없이 오갈 수는 없으니.”
낯익은 느낌을 좇아 보니 김현의 『행복한 책읽기』(1992)가 떠올랐다. 1986년 2월 25일, 그는 중세의 시 한 대목을 옮겨 적고 번역했었다.
“Ne renvoyez plus, mon ami / A moi parler: venez y vous, / Car messagiers sont dangereux
사랑하는 사람이여 사람을 보내 / 말하지 말고, 제발 직접 와주세요 / 중간에 사람이 끼면 위험하니까요”
닮았지만, 행수도 표현도 다르니 동일한 작품은 아니다. 윌더스가 인용한 구절은 한 익명 작가가 오비디우스의 『사랑의 기술』을 1240년경 프랑스어로 번안해 쓴 텍스트에 있다고 한다. 김현의 시는 어디서 왔을까? 『행복한 책읽기』에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원문을 따서 다시 구글에 넣었다. 시의 1행으로는 별다른 정보가 나오지 않았지만, 2행을 포함하는 검색결과 중 학술데이터베이스 ‘페르세(www.persee.fr)’가 제공하는 『로마니아(Romania)』 제1호의 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1872년, 아직 30대 초반인 ‘프랑스 문헌학의 아버지’ 가스통 파리스(Gaston Paris)는 동료 폴 메이에(Paul Meyer)와 함께 창간한 이 중세 로망어문학 학술지 창간호에 직접 여러 논문과 서평을 썼다. 내가 발견한 것은 어떤 중세 이탈리아 대중 노래 모음집 판본에 대한 서평이다. 1871년 조주에 카르두지(Giosue Carduggi)가 펴낸 이 책에서 “사자를 보내지 마세요”라 시작되는 이탈리아어 시구와 마주친 그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각주를 붙여 김현이 소개한 세 행을 인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ms. 12744, f° LXXI”라는 출처가 있었다.
“ms.”는 수고본(manuscrit)의 약자이며, 소장처 없이 고유번호만 적은 것을 보면 해당 문서가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있으리라 추정되었다. 프랑스국립도서관 산하의 디지털 도서관 ‘갈리카(gallica.bnf.fr)’로 가서 검색창에 “manuscrit 12744”를 넣으니 “프랑스어 노래 모음집. 악보 수록(Recueil de chansons francaises, avec musique notee)”이 눈에 띄고, 그것을 열어 71번 폴리오(folio)를 찾아 가자 문제의 시가 나타났다. 하지만 중세의 필체를, 그것도 흘려 쓴 듯한 글씨를 읽기가 녹록하지 않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문서 소개를 열어보자 가스통 파리스가 1875년 이 수고본 수록작들을 “프랑스어 고(古) 텍스트 협회(Societe des anciens textes francais)” 총서에서 『15세기 노래(Chansons du XVe siecle)』라는 제목으로 펴냈다는 반가운 정보가 있었다. 그 책 역시 갈리카에 있었고, 내가 보려는 시는 총 143편 중 105번으로 103-104쪽에 실려 있다. 다음은 그 전문의 번역이다.
“더는 보내지 마요, 내 연인, / 내게, 다른 사람 말고, 당신이 와요. / 사자는 위험하니까요.
어젯밤 당신이 보낸 사람이 여기 왔지요. / 더는 보내지 마요, 내 연인. / 그는 내게 당신 얘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 줄곧 내게 사랑을 청했어요.
그는 너무 잘생겼고 너무 귀여워요. / 더는 보내지 마요, 내 연인, / 그는 다홍빛으로 차려 입었어요, / 속에는 수놓인 사틴 천.
그를 또 내게 보내면 / ? 더는 보내지 마요, 내 연인 ? / 난 그를 갖고 당신은 버릴 거예요, / 줄곧 내게 사랑을 청하는 걸요.
당신이 아파 침대에 누워 있더라도 / 더는 보내지 마요, 내 연인. / 내 기꺼이 당신에게 가서 / 사랑의 표시를 보여줄 게요.”

’씌어진 대로’ 읽기
김현이 인용한 것은 파리스가 펴낸 텍스트의 처음 세 행에 해당한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김현이 “mon ami(내 연인)” “A moi(내게)”라고 쓴 부분을 파리스는 ? 수고본에서와 같이 ? “mon amy”, “A moy”로 쓴다. 그런데 사실 파리스 자신도 1872년에는 “A moy” 대신 김현처럼 “A moi”라고 적었고, 그 실수 덕에 나는 우회로를 거쳐서나마 1875년 판본까지 이를 수 있었다. 김현의 표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해 볼 수 있다. 인용자 자신이 현대어의 관습에 맞게 중세프랑스어의 철자를 고쳤거나 ? 하지만 그는 "messagiers(사신)"를 "messagers"로 고치지 않았다 ? 아니면 어딘가에서 이미 고쳐진 텍스트를 발견했으리라는 것. 하지만 어디서? 1986년 서울에 있던 그가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15세기 시편을 마주칠 수 있었을 경로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어느 꼼꼼한 연구자가 어느 날 고인의 장서나 독서 목록을 조사하다 보면 알게 될까.
『행복한 책읽기』에서, 위의 인용과 번역에 김현은 두 문장을 덧붙인다. “중세의 연애시의 서두이지만, 이 서두는 하나의 깊은 암시를 간직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작품은 직접 읽어야 한다는 권유로 이 서두는 새롭게 읽힐 수 있다.” 작자의 의도가 그러했다 보기는 어려우므로 독자의 평소 심려가 반영된 ‘오독’인 셈이다. 작품을 읽지 않고 2차 정보만으로 말하는 행태를 그가 얼마나 타기했던지 주변의 회고담에서 본 기억이 있기에 저만한 해석적 외삽은 이해할 만하다. 다만 “직접”이라는 단어가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 중세의 작품을 직접 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몇몇 옛날식 철자를 그대로 두었다 해도, 파리스의 텍스트가 수고본의 텍스트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는 출처에 없는 구두점을 찍었고, 행갈이를 명확히 했으며, “etc.”로 축약된 후렴구를 온전한 형태로 풀었다. 그렇다면 편집된 텍스트는 벌써 변형된 것이니 매번 수고본을 찾는 것이 ‘직접 읽기’인가? 그 생각이 합당한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용기를 낸들 만만한 일이 아니다. 수고본이 만약 여럿이라면 그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내 관심을 끈 시처럼 악보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노래’할 것인가? 파리스의 판본에서 오귀스트 제바르트(Auguste Gevaert)가 현대 기보법에 맞추어 정서한 악보를 발견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15세기에 이런 노래를 어떤 발성법으로 불렀고, 어떤 악기로 반주했는지는 또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누군가 이미 그 문제를 연구하여 적잖은 소득을 거두었겠지만, 현대식 악보도 읽지 못하는 처지에서야 이쯤이면 남의 공부를 따라간다는 것마저 아득하다.
프랑스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로망어 문헌학 입문” 수업을 청강했다. 일년 간 수업을 듣고도 수고본 한 줄 자신 있게 읽을 능력은 갖추지 못했지만, 첫 시간에 들은 문헌학의 정의만은 가끔 되새겨 본다. 문헌학이란 문학사, 비평, 언어학, 역사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과거 문헌의 일차적 의미를 씌어진 대로 이해하려는 학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씌어진 대로’ 읽기란 때로 어떤 해석보다 난해한 임무이다. 그것 없이, 하지만, 해석이 무엇일까. 역으로, 번연히 있되 보지 않던 사실을 마침내 보게 될 때 솟아나는 해석들, 의미들이 있다. 예를 들어 김현이 어떻게 저 몇 행의 시구를 찾아냈는지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의 비평과 연구에 대해, 1980년대 한국에서 프랑스문학 수용의 폭과 양상에 대해 무엇을 더 알려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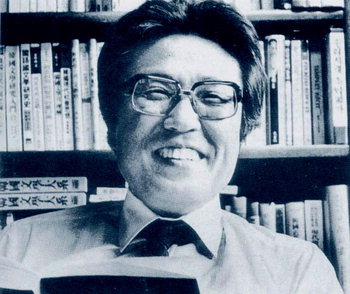
주어진 사실들
이런 범박한 생각들도 어떤 사실로부터 촉발된 것이다. 구글의 정보망 덕분이기도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원한 사실을 이미 누군가가 찾아내었다는 것, 그것을 마침 접근가능한 곳에 두었다는 것이다.
윌더스의 논문은 그가 수학한 이탈리아 파도바 대학 사이트에 있었다. 그 다음 찾아간 ‘페르세’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리옹대학 등이 운영하는 인문사회과학 학술자료 데이터베이스이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필요한 자료를 바로 열람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로마니아』는 발행 시점에서 5년이 지난 자료 전체를 페르세에 공개하며, 더 잘 알려진 예로 역사학지 『아날(Annales)』이나 롤랑 바르트가 글을 쓰던 『코뮈니카시옹(Communication)』 등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페르세와 비슷한 서비스로 케른(www.cairn.info), 오픈에디션(www.openedition.org)도 언급해 두자.
갈리카는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제공한다. 저작권 문제로 인해 20세기 전반 이후의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1997년 창립 이래 쌓여 온 정보의 양은 이미 압도적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5월 7일 갈리카에서는 신문 및 잡지 2,882,310부, 이미지 1,312,555점, 악보 49,467부, 지도 158,998점, 비디오 1,454점, 수고본 118,209권, 녹음 51,064점, 책 575,045권, 물품 369,093점을 열람할 수 있다. 이 숫자들은 게다가 나날이 변한다. 위에 언급한 ‘프랑스어 수고본 12744번’은 올해 2월 27일 업로드되었으니, 서너달 전이었다면 내 탐색은 필시 좌초했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찾아보던 중, 지난 달 프랑스 정부 고등교육연구혁신부 산하에 “열린학문위원회”라는 것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다. 사이트(www.ouvrirlascience.fr)에는 “열린학문이란 연구 출판물 및 자료의 제한 없는 보급을 뜻한다”는 정의와 함께, “프랑스는 학문적 연구의 결과물이 연구자, 기업, 시민 모두에게, 제한 없이, 유예 없이, 비용 없이 공개되도록 하기 위해 매진한다”는 목표가 밝혀져 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한국의 상황은 어떨까. 사기업이 운영하는 한국의 학술데이터베이스들이 대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상 접근불가능한 공간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다. 의외였던 것은 공공기관 쪽이다. 예컨대 국립중앙도서관 사이트에서 김소월의 『진달래꽃』(1925)이나 한용운의 『님의 침묵』(1926)의 파일을 구할 수는 없다. 『정지용 시집』(1935)은 있으나, 인쇄를 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 백석의 『사슴』(1936)은 열람조차 유료이다.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는 공개되어 있지만, 초판(1948)이 아니라 1955년판이다. 물론 국립중앙도서관에 모든 것이 있지야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어디선가는 그런 자료들을 수합하여 제공해야 하며 그것을 당연히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 이상한 것일까. 어쩌면 내가 생각치 못한 곳에 자료가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장 널리 쓰이는 검색 엔진 두 가지를 이용하여 수시간을 들여도 찾아낼 수 없는 자료라면 효용성이 의심스럽다.
위에 나열한 시집 다섯 권은 수년 전 ‘초판본 열풍’과 함께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올랐던 책들이다. 책이 팬시 상품처럼 취급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접했지만,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웠던 것은 저작권이 만료된 저 유명한 책들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이었다.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이 한국의 ‘콘텐츠’ 없는 온라인 생태계를 한탄해 왔는데,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가. “인터넷 문화를 진심으로 바로잡고 싶다면 질이 좋은 콘텐츠를 그것도 대량으로 제공하는 길밖에 다른 방책이 없다. 물론 비용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것인지도 아리송한 저 거창한 토목 공사에 비하면 사실 과자값에 불과하다.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사람이 그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만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역시 어려운 일이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겠는가.”(황현산, 「차린 것은 많고 먹을 것은 없고」, 2013)
인공지능을 챙기느라 부산하다는 “높은 자리”에 제4차 산업혁명 이전의 관심사가 전해질지 모르겠으나 굳이 한마디를 덧붙여 본다. 위에 언급한 페르세, 갈리카 등을 나는 한국에서 석사과정을 이수하던 중 알게 되었다. 덕분에 프랑스에 발 한 번 딛지 않고 13세기 시인 뤼트뵈프(Rutebeuf)에 대한 논문을 썼다. 읽지도 못하는 837번 수고본을 모니터에 띄우며, 어디선가 내가 공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 언제라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자료를 마련해 두었다는 이상한 생각에 감동했다. 1839년에 나온 최초의 뤼트뵈프 전집을 다운받을 때는 따라잡아야 할 학문의 두께를 가늠하며 무서워 했다. 만약 프랑스의 어떤 학생이 한국문학을, 예컨대 소월을 공부하려 한다면 그는 무엇을 발견할까. 학교 도서관이 마침 한국의 유료 학술데이터베이스에 가입해 주지 않는다면 그는 논문 하나마다 자신의 점심값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진달래꽃』 초판을 보기 위해 도서관이나 연구기관이 아니라 ‘팬시 상품’의 도움을 빌려야 할 때 그는 소월에 대한 우리의 진지함을 미심쩍어 할 것이다. 운좋게 무슨 자료를 찾은 다음에도 자료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온갖 비표준적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소월 시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믿지 못할 것이다. 가끔 들리는 표어를 빌려서 말해 보자. ‘한국학의 세계화’란 한국에 오지 않고 한국에 대해 얼마나 깊이 알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도 성패가 갈린다.
* 문성욱
소르본대 박사과정생·중세프랑스문학
13세기 시인 뤼트뵈프를 통해 중세문학에서 ‘저자’의 출현과 역사적 조건 사이의 관계를 조망하는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