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조 / 정문연, 동양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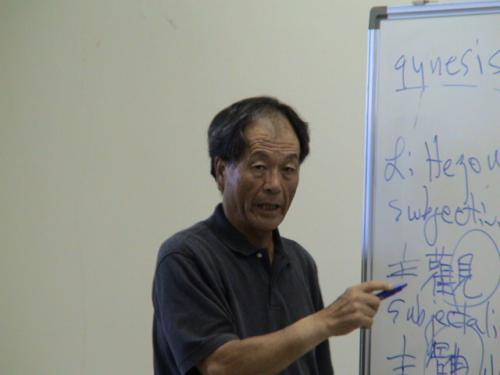 |
무엇보다 그 동안 산발적으로 뒤엉켜 듣던 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제의식과 방법, 그리고 갈래를 대강 정리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실존현상학과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정한 흐름이 동양사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읽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의 강의는 내가 시대착오적으로 선택한 길이 낡았지만 새로운 것임을 새삼 확인시켜 줬다.
이성의 '시선'에서 '몸의 언어'로
강의는 그가 출판한 책의 제목대로 '머리'가 아닌 '몸'으로 출발했다. 그는 보기보다 들을 것을, 생각하기보다 느끼기를 권한다. 이성의 '시선'은 대상을 포획하고 감시하고 규율하는 입법자로서 기능한다. 이 보는(eye) 자아(I)는 몸을 경멸하며,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강화하는 동일성의 폭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는 이 중심의 권력을 '해체'하고 부당하게 짓밟힌 '타자들'의 복권을 시도한다. 그는 그 타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1)몸, 2)여성, 3)자연, 4)동아시아를 들고, 이들이 연대하는 마당에서 자신의 철학 혹은 '몸의 정치'를 엮어나가고 있다.
그가 몸의 복권을 시도했을 때, 당장 '정치적 사고'로부터의 우려와 반발에 부닥쳤다. 그 이의제기는 강의 내내 반복됐다. 그가 몸의 촉감이 차가운 억압과 거리두기의 '시선'과는 달리, 만지고 어울리며 기뻐하는 주이상스(jousissance)의 여성적 축복이라고 나서자, 서울대의 김홍우,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김형효, 최진덕 교수는 몸이야말로 이기적 관심과 욕구의 근원이며, 이성은 그것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반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살로서의 몸이 윤리적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 나아가서 영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가 부러웠다. 그 말은 다름 아닌 그의 '몸'이 연출하고 있는 실제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로 옆자리에서 듣고 있던 부인도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나는 이렇게 물었다. "몸의 자연적 기능이 친교와 보살핌의 윤리로 발양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자각'되고, '개발'돼야 한다. 그 훈련은 미학적 연습 이상의 것을 요구한다." 그는 훈련의 필요성에는 동의했으나 자신은 수련자이기보다 해석자라면서 대답을 유보했다.
두 번째 논제는 '차별'이 아닌 '차이'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자아에서 타자로 중심을 이동할 것을 역설했다. '자아'의 계열은 다양하다. 그것은 '시선'이며, '이성'이며, '계몽'이며, '남성'이며, '휴머니즘'이며 '유럽중심'이며, '백인 신화'며, '기독교적 복음주의' 등으로 미끄러진다. 이 모든 중심에 '근대성'이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들 중심을 해체하고, 주변적인 것들의 영토를 부여하고, 차별을 철폐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진다.
그는 다양한 문화들의 크로스, 그리고 다양한 사유와 철학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변증적 대화를 새로운 문명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이것을 서구 중심적 '보편성universality)'에 대해 '트랜스버설리티transversality'라고 불렀다. 그 광장의 대화에서 누구도 민족주의적 폐쇄성과 우월성을 고집해서는 안된다고 한 다음, 한국학에 대해 이렇게 충고했다. "한국의 전통은 중국과 인도 등의 외래적 사고와의 변증적 대화와 재창조, 즉 트랜스버설리티의 과정이었다. 지금도 그러하다. 한국학은 자기 밖의 일본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다양한 '타자'의 언어와 문화, 사고를 익혀 새로운 트랜스버설리티를 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과들은 국제어로 출판되고 유통돼야 의미가 있다."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겠는가"
틀림없는 충고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정작 그 타자성이 부재한다는 사실이다. 외길의 근대화와 서구화의 결과, 우리는 트랜스버설리티의 선결조건이자 변증적 대화의 에이전트로서의 주체성을 상실했다. '고유한 시각'을 담지하고 있는 전통적 지혜는 골방에서 자신들만의 사적 언설로 소통하고 있고, 한편 대학에서 근대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즐겨 인용하는 뤼스 이리가리이의 표현을 빌리면, '동일한 언어로' 말하고 있어, 결국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나는 그도 또한 포스트모더니티를 통해서 동양사상에 접근하지 않았느냐고 슬쩍 질러보았다. 이것이 딜레마이다. 요컨대 중심이 해체되는 절호의 포스트모던 시대에, 우리는 정작 대화의 참여 자격인 '타자성'을 확보하지 못해 고뇌하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에게 혹, 이 곤경을 돌파할 무슨 묘수가 있으면 일러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선사처럼, 그건 질문자가 찾아나서야 할 길이라면서 웃었다. 그렇다. 그 길을 누가 가르쳐 주겠는가.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