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은 14조1,759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R&D 예산규모는 6조 8,110억 원으로 2018년 정부 R&D 규모 19조6,33억 원의 34.4% 수준이다. 이중 순수연구비는 13조원 대 수준이다.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예산은 점점 늘어난다. 그런데 그에 따른 혁신은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매년 쏟아지는 수많은 논문들과 특허들은 많지만 정작 쓸모 있는 것들은 눈에 보기 힘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원장 임기철)이 발표한 ‘2016년 기술수준평가’에 따르면,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주요국 논문 점유율(%)에서 한국은 평균 4.1%를 기록했다. 2006년 3.0% 대비 1.7% 소폭 상승한 수치다. 논문 영향력 지수에서 한국은 2006년 0.81에서 2015년 0.77로 하향했다. 논문 영향력 지수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EU를 대상으로 했으며 1.0 이하는 평균 이하를 의미한다. 분석 대상은 SCOPUS 등재 논문들로서 국가전략기술 내 세부기술명과 직접 관련 있는 검색키워드만 이용했다.
특허 부분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120개 국가전략기술 전체의 주요국 특허 점유율은 2006년 5.4%에서 2013년 6.9%로 소폭 상승했다. 특허 영향력 지수는 2006년 0.59에서 2013년 0.38로 하락했다. 분석 대상은 미국특허청에 공개된 것들을 중심으로 했고, 유효데이터인 2013년까지만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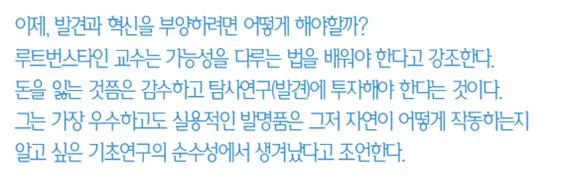
카오스재단의 ‘미래과학’ 강연 1강(정하웅 카이스트 교수)에 따르면, 특허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보단 기존의 특허들이 조합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즉, 새로운 게 없었다는 뜻이다. 미국은 1790년 7월 특허제도가 생긴 후, 2014년 12월 225년 동안 9백60만 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78%의 특허는 조합의 특허였다. 특허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혁신이 느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만큼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 정말 어렵다.
최근 한 언론사가 20년간 20개국의 논문 성과를 분석했다.(<한국경제> “4.5조 쓰고 ‘논문 공장’ 된 한국 대학…논문 질은 세계 평균 밑돌아”, 2017.9.19) 이에 따르면, 한국의 논문 건수 순위는 2006년 12위 이후 정체고, 피인용지수는 평균 1 이하인 수준이다. 한국의 대학은 논문만 쓰고 있는데도 그 양과 질에서 모두 정체이고 평균 이하라는 뜻이다.
논문 수, 영향력, 특허 출원 모두 답보
예산은 늘어나지만 그에 따른 혁신적 성과는 눈에 띄지 않는다. 왜 그런 것일까? 비슷한 논문만 제조해내서는 결코 과학적 창의성을 발현할 수 없다. 한 과학자가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된다면, 그는 어떻게 한 것일까? 우선 발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와 관련 최근 발간된 『과학자의 생각법』(을유문화사 刊, 버트 루트번스타인 지음)을 주목해보자.
미시간주립대학교 생리학과 교수인 루트번스타인은 ‘발견’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한다. 발견은 이미 발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발견이 발견자를 선택한다. 일상의 숭고함 속에서 우연히 발견이 일어나기도 한다. 발견이란 무언가 새로운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떤 현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더욱이 발견하기 혹은 발명하기에 논리가 있는 것인지, 발견하기를 가르칠 수 있을지 따져봐야 한다.
책에는 발견의 사례가 소개된다. 18세기 프랑스의 화학자 클로드 루이 베르톨레는 그 당시 신봉되던 화학 물질의 ‘선택적 친화성’을 극복한다. 화학적 상호작용의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한 마디로 화학의 물질 작용은 단방향이 아니라 쌍방향이라는 뜻이다. 제한된 가설과 현상에 의해서 친화성이 선택적으로 보였던 현상은 침전 반응이라는 방법이 만든 인공 사실이었다. 인공 사실이란 어떤 현상을 의미하는 실험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현상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 과학자들은 ‘소다+염화칼슘 → 소금+석회 침전물’을 만든다고만 이해했다. 그 반대로 ‘석회+소금 → 소다+염화칼슘’이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베르톨레는 나트론 호수에 갔다가 물이 있는 곳에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호수의 물에는 소다, 소금, 석회와 염화칼슘이 들어 있어 과학의 예측에서 변칙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결국 베르톨레는 ‘질량 작용(mass action)’의 원리로 유명해진다. 그는 지식, 경험, 물리, 화학, 산업, 지리학, 지질학 등 모든 수단을 결합했다.
그때 화학자들은 친화성의 상대적 강도를 다루는 자료가 거의 없었고 이 때문에 화학 물질에서 일어나는 평형 반응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베르톨레는 이 기괴한 현상이 라부아지에가 말한 것처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평형이 일어난 것임을 알아챈다. 또한 베르톨레는 라플라스가 주장했듯이, 화학적 친화성을 중력 끌림의 한 형태인 변칙 현상으로 설명한다.
베르톨레는 화학 물질의 많은 ‘질량’이 생성물(침전물)이 반응물로 가는, 즉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두 부류의 경쟁하는 친화성 집합이 있으면 많은 질량을 가진 쪽이 방향을 결정하는 셈이다. 베르톨레는 “약한 친화성을 만회할 정도로 충분한 질량을 가진 화합물이 있다면 모든 화학 반응은 가역적”이라고 주장했다.
베르톨레의 한계는 왜 질량 작용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50살이 넘어서 기존의 화학 법칙의 변칙 현상을 통해 혁신적인 발견을 이뤄냈다. 그의 사례는 그 이전에 획득한 자료, 이론, 기술들의 집합, 다양한 경험 등이 작용한 결과다.
선택적 친화성에서 질량 작용 원리로
각종 지표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미국 역시 혁신과 창의성은 답보 상태이다. 1665년부터 지금까지 과학 학술지는 15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 과학자들의 수는 80년마다 2배로 늘었다. 자료를 조사한 과학사학자 드 솔라 프라이스의 주장에 따르면, 1660년대 이래로 과학의 ‘규모’는 100만 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은 100만 배는커녕 1000배도 안 되는 수준이다. 루트번슈타인 교수는 과학적 발견의 진보는 과학 규모(거대과학)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다고 피력한다.
10월 초에 발표된 노벨상 소식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제, 발견과 혁신을 부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루트번슈타인 교수는 가능성을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다. 돈을 잃는 것쯤은 감수하고 탐사 연구(발견)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기초 원리는 필요가 만드는 연구가 아니라 호기심이 이끄는 연구로 발견”된다며 “가장 우수하고도 실용적인 발명품은 거의 언제나 이미 기술적 목표나 응용법을 염두에 두어서가 아니라 그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은 기초 연구의 순수성에서 생겨났다”고 조언한다.
『과학자의 생각법』은 발견의 구체적 방법도 알려준다. 우선 중요한 문제를 찾는 게 위대한 연구의 시작이다. 이에 대한 직감이 필요하다.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과학의 핵심인 가설은 자료와 이론 사이의 불일치인 문제를 통해 나타난다. 불일치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가설이 정의된다. 또한 중심 원리인 독단을 거부해야 한다. 연구란 영어로 ‘research’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re’, 즉 다시 찾아본다는 것이다. 발견의 방법을 실천하는 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결국 이로써 혁신과 창의성이 좌우된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