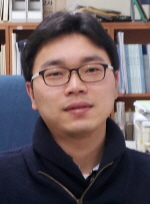
노계 박인로(1561∼1642)가 지은 「누항사」의 한 대목이다. 궁핍한 현실을 이기지 못하여 借牛에 나섰다가 망신만 당하고 돌아오는 장면의 일부로, 혹자는 그의 가난을 2차적 목적을 위한 위장적 포즈로 읽기도 하지만 필자는 그의 진심을 믿어주고 싶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현실적 궁핍과 학문적 당위라는’ 겸장키 어려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 성리학자의 모습은 역사적 시공을 뛰어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인문학도의 그것과도 근사하게 중첩된다.
학문후속세대의 조그만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중한 지면에 필자가 박인로를 불러들인 것은 단순히 그가 겪었던 삶의 신산한 고초들에 ‘오늘’을 투사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지나치게 비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고초들에 대한 대안의 마련에 사회적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의 입장이 반영될 여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그를 경유하여 되묻고자 하는 바는 ‘박인로로 하여금 현실과 학문이라는 선택지 중 후자를 택하게 만든 모종의 매력을 과연 오늘날의 인문학이 담보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누항사」에 대한 독해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가 종국에 선택한 것은 ‘太平天下애 忠孝를 일을 삼아 / 和兄弟 信朋友 외다? 리 뉘 이시리’로 대변되는 가난한 성리학자로서의 삶이었다. 굶주리는 가솔들을 뒤로한 채, 그리고 사회적 공명의 성취를 포기한 채 ‘爲己之學’의 길로 그를 침잠시킨 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방향에서의 해석도 가능하겠지만, 필자는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현실적 궁핍을 감내할 만큼의 다른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다른 무엇’의 정체일 터, 이는 바로 개인의 수기적 완성을 통해 세계의 우주적 이치를 구현한다는 성리학 특유의 인문적 아젠다였다. 현실적 재부의 축적보다도 개인적 도덕의 완성을 우선시하고 당연시하는 이론적 단서들이 ‘거기’에는 내장돼 있었던 것이다.
기실 이윤의 창출과 효율의 제고를 주된 기조로 삼는 근대 자본주의 체제가 신자유주의라는 동종이형의 형태로 자가 증식하는 가운데 삶과 인간의 문제를 학문적 모태로 하는 인문학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거나 혹은 그리 치부되지 않기 위해 일정한 변신을 감행해 왔다. 통섭 내지 융합이라 불리는 새로운 학문적 경향이 그것으로, 분과 학문 체제가 감당하지 못하는 수다한 문제들을 교류와 협력, 학문 간의 횡단을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한 것이다. 물론 상당수의 경우에는 당초의 목표에 부합할 만한 그럴듯한 성과들에 도달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한 것은 이익과 효율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강고한 축대에 과연 어떠한 균열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이다.
인문학이 이윤의 창출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이렇게 묻고 싶다. 부의 축적을 삶의 풍요와 등가화시키는 우리의 관념과 인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가시적인 무엇이 생겨야만, 유형적인 무엇이 생겨야만 그것은 이익으로 환산될 수 있는 것인가? 푸코가 ‘장애’가 아닌 ‘정상’의 범주를 되물었듯 우리는 가난을 바라보는 사시적인 시선 자체의 기원에 대해 되물어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근대’와 ‘자본’의 폭식성과 비인간성에 대해 좀더 강인하게 말해야 할 때가 이미 와 버린 것은 아닐까?
오늘의 삶이 最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필자가 공부하는 옛적의 문헌들은 종종 말한다. 물론 그 시절 또한 무분별한 욕망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 이합집산이 정해지는 불가피한 ‘인간의 시대’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지식인들은 앎과 삶의 일치가 보다 나은 사회적 갱신과 유관하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했다. 이러한 인식이 다소 낭만적이라면, 적어도 그들에게 학문적 자양을 제공했던 성리학의 기본적 모토는 그러했다. 인식이 토대를 결정할 수도 있는, ‘前近代’가 아닌 ‘非近代’의 삶이 그때 거기에는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과는 다른 ‘사물의 질서’가 지금과는 다른 ‘삶의 질서’를 꿈꿔 볼 수 있게 하지는 않을런지.
누군가가 말했듯 현실과 학문이라는 선택의 기로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하지만 후자가 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곧 앎이 삶을 구원할 수 있다는 옅은 희망이 조금 더 선명해질 때 그러한 기로를 과감히 선택하는 또 다른 우리도 많아지지 않을까? 이상의 군말들은 「누항사」를 읽기 위해 노계의 경제적 기반에 천착하는, 비교적 근자에 나온 글을 읽고 들게 된 愚問이다.
하윤섭 경기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구원
조선조의 오륜 담론과 오륜시가를 가지고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