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도서’가 약탈당한 지 145년 만에 반환돼 화제가 되고 있다. 유출문화재에 쏠리는 관심을 읽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거 조선 지식인들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던 전적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분위기다. 특히 올해는『서림청화』(청나라 말기에 출간된 판본학·목록학 전문 서적)가 저술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고문헌연구가인 박상철씨가 최근 이 책을 번역(푸른역사, 2011.6)했다. 중국본 고서를 우리 학술사, 지성사의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그의 주장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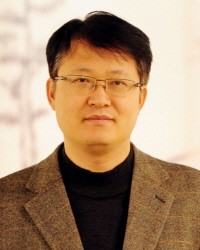
일본 궁내청 書겓部에는 중국 고서인『通典』이 소장돼 있다. 중국에서도 희귀한 겗宋本고서인 까닭에 일본의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사실은 고려 숙종 때부터 임진왜란 당시까지 조선왕실에 보관돼 있다가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유출된 책이다.
한국에서의 중국본 고서의 위상은 좀 특별하다. 중국에서 출판한 책으로만 치부하기엔 우리의 문화 속에 너무 깊숙이 개입돼 있고, 그 중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것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일 것이다. 먼저 중국본은 조선시대 우리 출판물의 底本이었다. 조선시대 출판 방식의 하나는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을 수입해 활자나 목판으로 재간행하는 것이었다. 이런 방식의 출판은 정보의 수입과 유통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중국과 교류를 시작한 이래 꾸준히 추진됐다. 이렇게 간행된 서적은 상당수에 이른다. 중국본 고서가 조선의 출판과 장서문화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첫 번째 이유이다.
또한 중국본은 조선시대 출판의 공백을 보충했다.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며 조선 출판시스템이 붕괴됐던 시기에는 그 역할이 더욱 컸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중요한 전적의 상당수가 멸실됐고, 출판의 핵심이었던 동활자와 고려조부터 전해오던 왕실도서들은 약탈되거나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출판을 하려고 해도 그 저본마저 구하기 어려운 출판공황이 발생했다. 정부는 멸실된 전적들을 정비하기 위해 국내에 흩어져 있던 서적들을 수집하고 사신을 보내 명나라로부터 수입을 추진했다. 중국본의 수입은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서적을 보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런 현상은 조선 지식인들의 장서구조를 바꿔 놓음으로써 문학과 사상에까지도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뒤바뀐 조선 지식인들의 장서 구조
또, 중국본은 조선 출판문화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조선과 중국 출판문화의 가장 큰 차이는 상업출판의 성행 여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수요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상업출판의 성행은 광범위한 서적의 유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書種이 다양해진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는 상황이 달랐다. 빈약한 경제력과 주자학 일변도의 사상적 흐름, 이에 따른 서적에 대한 한정된 수요는 官版중심의 출판시스템을 유지시켰고, 이는 본격적인 상업출판의 출현을 지연시켰다. 더욱이 활자본이 관판 출판의 중심이 되면서 출판은 행정의 일부가 돼버렸다. 이러한 출판 방식은 서적의 수요가 일부 계층에 한정돼 있었던 조선의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중국본의 수입은 조선에 부족한 서적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조선에서 출판되지 않은 서적들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선조들이 수입한 중국본은 또 다른 형태의 우리 책이라 할 수 있다. 조선에 수입된 중국본은 형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조선 지식인들은 중국본 서적을 수입하자마자 대부분 능화문이 들어간 조선식 장정으로 바꿨다. 우리 책의 형태로 개장한 것이다. 여기에 새롭게 제목을 쓰고 정성스럽게 장서인을 찍었다. 그리고 때론 빼곡히 필기를 남기기도 했다.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조선으로 수입된 중국본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다.
현재 국내외 도서관에는 이런 모습을 한 엄청난 양의 중국본 고서들이 남아 있다. 이들은 조선본 코너가 아닌 중국본 코너에 꽂혀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중국본 고서가 아니라 조선 지식인들의 지적 탐색 과정을 보여주는‘우리 책’이다. 조선에서 간행되지는 않았지만 조선 지식인들의 지적 자양분이 된‘우리 책’이다. 이렇게 볼 때 고대 중국의 출판문화와 중국 古書에 대한 이해야말로 조선시대 우리 출판문화 이해의 첩경이라 할 수 있다.
중국에서 간행된 책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도외시하면서 조선의 지성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된 조선의 학술사를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10여년 전 나의 고민이었다. 나는 이 고민을『書林淸話』의 번역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서림청화』는 청나라 말기의 학자 葉德輝(1864~1927)가 엮은 판본학·목록학 분야의 고전적 저술이다.
전통적인 筆記형식의 저술로서 형태상으로는 전혀 새로울 게 없다. 하지만, 『서림청화』는 중국 고대 출판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논술한 최초의 저작이다. 게다가 고서의 판본에 사용되는 각종 용어와 명칭을 정리하고 그 근원을 추적했다. 또한 역대 출판기관과 그 곳에서 출판한 서적들을 시대별로 정리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후 등장한 수많은 저술에서『서림청화』를 인용하고 있다. 중국 고서의 판본과 고대 중국의 출판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보다 더 적당한 저술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독서 주체와 지식 유통의 문제
올 해는『서림청화』가 저술된 지 100년이 되는 해이다. 여전히 우리의 선조들이 수입했던 중국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남의 나라에서 간행된 책이기에 우리 책이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출판의 주체만큼이나 독서의 주체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은 지식 유통의 문제이자 우리 학술사, 지성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서림청화』는 중국 출판문화 전반을 비교적 깊이 있게 다룬 최초의 저작으로 출판과 판본에 관한 수많은 물음을 던지고 대답한다. 나는『서림청화』를 읽으면서 중국과 조선의 출판문화에 대한 많은 영감을 얻었다. 섭덕휘가『서림청화』에서 던진 질문을 조선의 출판문화에도 똑같이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서림청화』의 저자가 가지고 있던 제의식을 우리 고서에도 적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철상 고문헌연구가
한중 古文獻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의 특질과 한중 문화 교류 등을 연구하고 있다. 논문으로는「『완당평전』, 무엇이 문제인가?」등이 있다. 저서로『세한도』,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공저) 등이 있다. ‘포럼 그림과 책’의 공동대표다.
 번역 제공
번역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