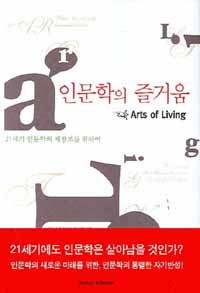
美 럿거스대의 인문학자 커트 스펠마이어는 대중들이 인문학을 이렇게 사고하도록 만든 것이 인문학자들 스스로라고 문책한다. 인문학의 사회적 위상, 그리고 인문학 논쟁의 궤적을 천착하는 이 책은 “대중들이 인문학을 낯설어할수록 인문학자들은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텍스트에 몰두하며 자신만의 공간을 더욱 강화”한 인문학자들이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를 가져왔다고 진단한다. 스펠마이어는 폭주하는 자본주의 질서를 탓하는 벨라를 향해 ‘인문학의 변론’일 뿐이라 말한다. 위기의 원인을 외부로부터 찾는 이런 주장은 “인문학 그 자체가 탄생시킨, 학교와 대학이 최고의 예술과 사상의 적당한 거처라는 신화를 영속시키는 것”일 뿐이다.
인문학 스스로가 고립을 자처했다는 저자의 근거는 무엇일까. 저자는 인문학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레비스트로스와 아마추어 여행가 핸슨의 글을 비교하며, 핸슨이 오히려 사회이론가들이 천착하지 못했던 질서의 예측불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문학자들이 인문주의적 사고를 학문적 혹은 엘리트적인 것과 대중적 혹은 민주주의적인 것 양자를 양분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텍스트와 전문화에 매몰된 “인문학이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이제 인문학이 사람들에게 실제 삶 너머를 보라고 해서는 안된다”고 말한다. 대신 “인문학 스스로 사회와 공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주의를 배척하고 지역과 일반시민, 사회 등 인간의 실제적 삶이 일어나는 공간과의 민주적 소통이 인문학에 생명수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인문학자들을 향한 저자의 실천지침은 ‘문화 형성에의 직접적인 개입’이다. 문화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세계’로 지칭되는 일상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인문학 위기론’이 세차게 휩쓸고 간 자리에는 사회와 정부를 향해 ‘인문학을 존중해달라고 호소’하는 식의 위기탈출법에 대한 많은 반성들이 있었다. 사회가 인문학을 환영하고 지원한다고 해서 인문학이 부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문학의 갈 길에 대한 스스로의 뼛속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는 깨달음이다. 저자가 말하는 ‘즐거운 인문학’의 원리와 실천지침이야 말로 우리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김혜진 기자 khj@kyosu.net
 번역 제공
번역 제공

